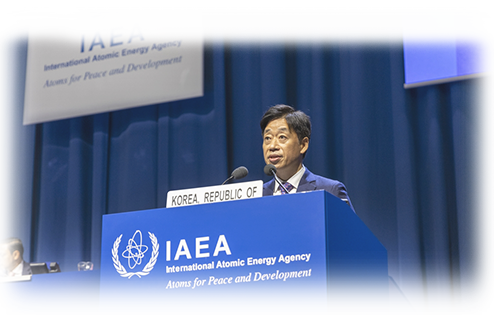정책 포커스
패권 경쟁 시대의 거대과학시설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다. 팬데믹에 기후변화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인류가 떠안은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닌데, 물리적 충돌로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정치적인 이슈 외에도 두 강대국은 대만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산업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를 구상하고 한국도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소위 반도체 지원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표면화했다.
그런데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칩과 과학’법이다. 언론 보도는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과학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진흥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느껴질 정도다. 과학기술에서만큼은 중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 과학계는 법안을 지지해준 의원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자며 환호하고 있다.
과학기술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그간 중국이 보인 행보는 대단한 것이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시설을 건설하는 한편, 천인계획 등을 통해 선진국의 우수한 과학자를 대거 유치했다. 이를 통해 서구에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되었던 과학의 정수를 비교적 빠르게 자국 내에 이식할 수 있었다.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위협을 느낄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법을 어기고 중국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몇몇 과학자를 기소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대과학시설에서도 미국의 우위가 흔들린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런 것들이 법안 통과의 배경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순히 산업 육성과 보호라는 관점을 넘어, 국제 관계와 전략을 고려한 과학기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거대과학시설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소수 강대국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기 때문이다.
유럽은 국제 협력의 전통이 깊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치는 데 익숙하다. 십여 개 나라가 참여하여 스웨덴 룬드에 유럽 파쇄중성자원을 건설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열핵융합실험로 사업에 2003년부터 참여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 협력을 더 확장해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반면 국내 시설은 국제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프랑스 그르노블, 스웨덴 룬드, 영국 옥스퍼드 등 유수의 연구 거점에서는 방사광가속기와 중성자 연구시설처럼 서로 관련 깊은 시설은 같은 장소에 설치한다. 대학, 기업과 함께 자연스럽게 시너지를 발휘하고 해외에서 많은 과학자가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시설 간 연계에 대한 고려 없이 방방곡곡에 분산하기만 해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수의 대학과 연구 기관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국가적인 시설은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지고 공동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보유한 기관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곤란하다. 영국은 과학기술시설위원회(STFC), 독일은 헬름홀츠 협회에서 거대과학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도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동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사례가 있다. 포항 방사광가속기가 우리나라 시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칭송받는 이면에는 정부에서 만든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공동이용지원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들어섰다. 앞으로 다가올 전대미문의 격랑에 견디기 위해 우리나라가 믿을 구석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다. 국가의 미래와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대과학시설이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 커다란 방파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