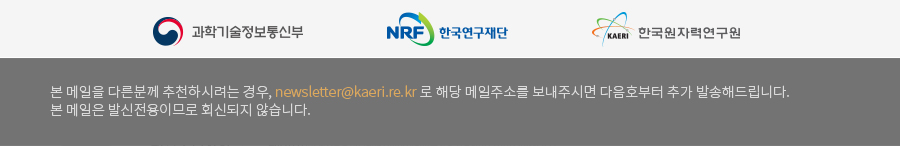1956년 7월 8일, 미 디트로이트 전력회사 사장이었던 월터 시슬러가 이승만대통령을 만났다. 그 날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시슬러는 ‘에너지 박스’라고 이름 붙인 상자를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직접 열어보였다. 상자 안에는 3.5파운드의 석탄과 우라늄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석탄을 태우면 4.5kWh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같은 무게의 우라늄을 태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천2백만kWh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단 1그램의 우라늄으로 석탄 3톤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시슬러와의 만남은 일찌감치 원자력의 위력을 인식하고 있던 대통령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이 오늘날 한국의 원자력을 만들었다.
영국은 2030년까지 무어사이드에 총 3GW 규모의 차세대 원전 3기를 건설하려 한다. 사업비가 150억 파운드(약 21조원)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당초 도시바가 지분을 갖고
있는 ‘누젠(NuGen)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시바가 누젠 지분 매각에 나섰고 한전과 ‘원전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인수 전쟁에 뛰어들었다. 한전은 이 인수 전쟁에서 중국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에 우리의 원전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영국은 1952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실험에 성공한 원자력 선진국이었다. 현재도 15기의 원전이 전체 전력의 20% 이상을 생산 중이다. 이처럼 앞선 원자력기술을 보유하던 영국이 어째서 외국 기술에 의존하게 된 것일까? ‘잃어버린 20년’ 때문이다.
1989년 이루어진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북해산 석유와 가스에 비해 원전 경제성이 악화되자, 1995년 건설 예정이었던 원전 계획을 취소했다. 이후 영국에서는 20여 년 간 원전건설이 중단되었다. 원전산업의 운명을 시장에 맡겨놓은 채 방치한 것이다.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북해유전의 고갈이 예상되고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해지자 영국 정부는 다시 원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그동안 원전 건설 중단으로 기술력이 약화되어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외국 기술로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영국이 원전을 건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영국의 에너지정책이 기후변화 방지와 에너지안보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과 가스의 비중을 줄이고 원전과 신재생을 늘리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에 발표된 영국 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2035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46%, 원자력이 36%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영국의 에너지정책은 한마디로 탈탄소화(Decarbonization)라고 할 수 있다.
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이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그릇된 행동을 보면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릇된 행동이 스승이 된다는 뜻이다. 이 말에 빗대어 만든 말이 정면교사(正面敎師)라고 한다. 이는 ‘남의 본받을 만한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것’ 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영국을 보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정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역시 세상의 이치는 오묘하다.